믿음이란 신념으로 수많은 과학자를 화형대에 매달았던 로마기독교의 오류가 논리정연한 과학 앞에 무릅을 꿇기 시작한 17세기는 공명약과 경도에 대한 의문에 가득 찬 대항해시대였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3번째 소설 <전날의 섬>을 완독했습니다. <장미의 이름>이나 <푸코의 추>에 비해 적은 부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몇권으로 분권된 전작들과는 달리 700페이지 단권으로 출판된 한국어판의 두께는 적지 않은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17세기 경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태평양을 항해한 이탈리아 귀족의 모험담을 담은 소설은 대략 간략한 네러티브 보다는 그 가지를 이루는, 당시에는 진실로서 받아들여지던 과학적 정의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갈구로 가득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 파리의 살롱에서 벌어진 귀족적 지식의 허세, 경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암투,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짝)사랑의 환상은 에코 특유의 고급스럽고 지적인 문장과 섬세한 묘사를 통해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지금까지의 에코소설과 마찬가지로 <전날의 섬> 역시 교묘한 액자구조로되어 있습니다. 이태리 하급귀족 "로베르토 라 그리바"가 난파선에서 적었던 수기와 소설을 한 고문서 수집가가 다시 풀어 적은 구조로 되어 있는 <전날의 섬>은 14세기를 배경으로 한 <장미의 이름> 그리고 20세기(이제는 지나가 버린 세기지만)를 배경으로 한 <푸코의 추>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17세기라는 절묘한 설정으로 온갖 미신이 판치고 거짓이 진실로서 대접받는 구태의연한 세상의 인간과 새로운 세상을 향해 새로운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지식인들의 뜨거운 설전을 담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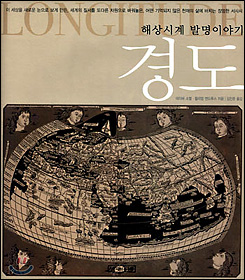
<전날의 섬>의 세계에서 4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앞으로 400년의 시간이 더 흐르면 우리가 지금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제 모습을 찾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빛의 속도를 넘어 설 수 없다고 믿었던 시절, 화폐단위로 이루어진 경제 활동이 사회조직의 기반일 수 밖에 없다고 믿었던 시절, 흡연자에게 온갖 박해를 다해 담배를 끊게 만드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시절...
글쎄요. 이 모든 것이 <전날의 섬>에 갖혀 결코 오늘에 이를 수 없는 허상은 아닐런지요...





최근에 달린 코멘트
Butterfly Kiss 21 - 최근 댓글